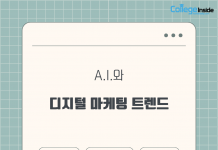1. 유학생활을 하며 느낀 기묘한 현상 중 하나는 유학생들은 타지에 오는 순간 ‘애국자’가 된다는 것이다.
“외국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 역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삼일절같은 국경일이 되면 친구와 함께 색연필로 손수 태극기를 그려 기숙사 문 앞에 붙여놓기도 했고, 학교에서 ‘충성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할 일이 생기면 국제 학생들은 가슴에 손을 얹는 대신 손을 등 뒤로 숨기고 ‘나는 내 나라의 국기에만 맹세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뿌듯해 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열을 올렸는데, 한국의 전통 음악을 알리겠다며 친구들과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며 사물놀이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다. 꼭 무언가를 준비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인으로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뒤쳐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이 공연은 학교에서 주최했던 국제학생들을 위한 행사에서 열렸는데, 다른 나라 학생들이 사물놀이 공연을 보며 멋지다고 감탄하면 괜스레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를 널리 퍼뜨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뿌듯했다.
각 나라의 영화를 틀어주는 행사에서, 한국은 자막 문제로 최신 영화 중에는 마땅히 틀어줄 만한 영화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몇 날 몇 일 시간을 내어 영화 ‘의형제’의 자막을 만들기도 했고, 학교의 정기 공연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가요를 영어로 번역하여 전교생 앞에서 불렀다.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너무 화가 났다. 막상 한국에 살 때에는 이것 저것 불평을 일삼던 나였는데. 떨어져 있을 때 조금 더 애틋해 지는 건 연인 사이 뿐만이 아닌가 보다.
2. 두번째 기묘한 이야기는 ‘인종 차별’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인종의 다양성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가 심한 편이다. 그래서 길거리에 동양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조롱하기도 했고 쇼핑몰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원숭이 흉내를 내며 깔깔대고 비웃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자리를 바로 피해버리며 애써 무시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쇼핑몰에서 나와 친구들 뒤에서 깔깔대는 백인 두 명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들에게 다가가 “내 얼굴을 보고 다시 말해보라”며 강하게 대응했다. 나는 그 들이 우리에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후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피하는 대신 맞서 싸웠는데, 항상 그에 따른 반응은 대부분 한결같았다. “미안하다” ,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았다”, “장난이었다” 였다. 대놓고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3. 세번째는 미국 역시 학교에 각종 괴담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도 많은 괴담들이 있었다. “잠겨진 채플에서 가끔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라던지 “학교 지하가 사실은 시신 안치실이었기 때문에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와 같은 이야기들이었다. 실제로 그 괴담들을 들으면 너무 무서워서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괴담들 가운데 가장 인상깊었던 이야기는 친구가 다니는 대학교에 떠도는 괴담이다. “일학년 때 캠퍼스에 만발한 벚꽃이 다 질 때까지 솔로인 사람은 졸업할 때까지 쭉 솔로”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괴담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들었던 피아노 소리에 관한 괴담보다 훨씬 무섭지 않은가? 괴담이란 나라를 불문하고 어디를 가던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괴담들은 항상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