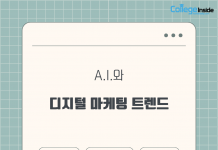중학교 시절부터 내 장래희망은 꽤 확고한 편이었다. 바로 광고 기획자(AE; Account Executive)였다. 30초 남짓한 시간에 사람들에게 간결하지만 굵고 인상깊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광고의 세계가 멋있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와중 나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영상 편집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방송 PD라는 직업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다행히 광고 기획자와 방송PD 모두 내 전공인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되어 있었지만, 어떤 일이 더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일이 더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다. 고민의 해답지는 바로 ‘인턴십’이었다.
2015년 여름, 대학교의 첫 1년을 끝낸 직후, 오랜 시간 꿈 꿔왔던 광고의 본거지에 발을 한 걸음 들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DDB라는 유명한 광고 대행사의 하계 인턴십이었다. 첫 인턴십이기에 면접부터 출근 그리고 상사들까지 내가 겪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사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다. 정말 막내로서 커피 심부름만 하게 될지, 혹은 온 종일 복사나 프린트만 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다. 정답은 ‘아니다’였다. 광고주 미팅에 함께 참가했고 외주들과 퇴근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스케줄 조정을 해야했으며 회의 자료들을 준비하거나 녹음실에서 성우가 녹음하는 일을 보조하기도 했다. 또 ‘상사’란 드라마에서 봤던 것 만큼 그저 무섭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는데, 인턴 마지막 날 광고에 관련한 책과 함께 받았던 상사들이 써 준 롤링 페이퍼는 나를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짧은 기간의 인턴 생활이었지만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다. 하지만 별개로 이 두 달간의 경험을 통해 내가 몇 년간 가졌던 ‘광고 기획자’라는 꿈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었다. 조금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광고주’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서 생존해야 하는 광고 대행사의 일이 정말 내가 꿈꿔왔던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광고의 세계인가?

그렇게 오랜 시간 가졌던 꿈에 대해 의문을 품은 채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미국에서 2학년으로 재학하며 EBS America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학생 PD로서 ‘College Report’라는 EBS 프로그램의 USC편을 제작하는 일이었다. 연출, 촬영 그리고 편집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해야 했고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거대한 방송국 전용 카메라와 여러 장비들을 낑낑대며 들쳐 메고 뛰어다니기도 했으며 복잡한 전문 장비들의 작동법 때문에 한참 애를 먹기도 했다. 편집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소프트웨어 오류때문에 완성 되어가던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선 울 뻔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긴 고생 끝에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 내린 나의 결론은 ‘내가 생각보다 이 일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었다. 엔딩 크레딧에 오른 내 이름에 <총괄 연출 및 편집>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간의 고생을 싹 잊을만큼 뿌듯했고, 평소 집중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었던 내가 열 네 시간 가량 화장실도 가지않은 채 오로지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 편집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또한 EBS 사무실에 찾아가 한국에서 잠시 미국에 오신 PD님과 종종 미팅을 가졌는데 프로그램에 관련한 의논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PD님은 내게 ‘너는 천상 PD’라는 칭찬과 함께 졸업 후 좋은 PD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후 내 꿈은 확고하게 방송 PD가 되었다는데, 이 인턴 경험이 ‘Resume에 쓰일 한 줄의 경력’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있는 이유이다.
이듬해 여름, 다양한 경험의 가치를 알게 된 나는 FleishmahHillard Korea(이하 FHK)라는 홍보 대행사에서 하계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FHK에서는 주로 자료 조사 및 번역 업무를 많이 맡았었다. FHK에는 내가 일 했던 다른 곳들에 비해 인턴들이 일고여덟 명 정도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는데 같이 일 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인턴들 끼리 이렇게 끈끈한 경우는 처음이다’는 말도 들었다. 정직원으로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수 없이 나누기도 했다. 이때 만난 인턴들과는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턴십을 통해서 경력을 떠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출근 마지막 날에는 직원들 앞에서 Wrap Up Presentation을 하며 내 인턴생활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사실 짧게는 두어 달 일하다가 떠날 인턴 사원에게는 중대한 업무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커피 타기나 복사와 같이 무조건 단순한 일들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 수집을 하기도 하고 전문 용어로 가득한 자료를 번역해야 할 일도 많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 일종의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궁극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그들은 묻는다. “그래서 인턴 생활을 통해 얻는게 뭔데?”
그들의 말이 사실상 틀리지는 않았다. 업무 자체에서 얻는 직접적인 도움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턴 사원에게는 보수를 주지 않는 회사도 상당히 많다. 단순 업무를 하며 열정 페이를 받으러 방학의 대부분을 희생하는 것이 어쩌면 시간 아깝고 무의미 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턴 경험은 당신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며 얻었던 이론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당신이 정말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또 이대로 나아가면 앞으로 걸어갈 몇 십년의 인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알려줄 20대 초반이 손에 쥔 어쩌면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 인턴 생활 내내 잔 심부름만 한 기분이라고 투덜댄다면 나는 그에게 말 해주고싶다. 당신은 분명 그 과정에서 분명 ‘값진 그 무언가’를 얻었으리라고. 마치 내가 ‘방송 PD’라는 사회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확고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또 미래의 어리숙한 ‘사회 초년생’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좋은 사람들을 얻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