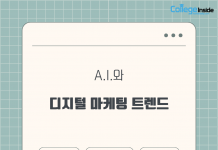배우 윤여정이 2014년에 tvN ‘꽃보다 누나’에서 말했다. “60이 되어도 몰라요.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이 처음이야.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하지.”
대학교는 내가 늘 원했듯이 앨라배마(Alabama)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2014년 가을, 시카고 근교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입생이 되었다. 일주일의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너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기숙사 생활을 접했다. 모든게 즐거웠고 무엇보다 신기했다. 하지만 개강을 하면서 나는 우물도 대도시의 우물이 아닌 시골 동네의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깨달음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
가족이 이민생활을 시작하면서 살게된 곳은 미국 남부에 위치한 앨라배마주에 있는 헌츠빌이라는 도시다. 지난 10년간 일자리 그리고 인구가 늘면서 점점 도시화됐지만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나름 명소인 U.S. Space & Rocket Center 외에는 건물도 별로 없고, 땅만 쓸데없이 넓어 보이는 미국 시골 동네였다. 잠시만 머무르다 캘리포니아 같은 곳으로 이사가길 희망했지만 결국엔 헌츠빌에서 공립 학교 시스템에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입학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동안 같은 학교에 나 말고 다른 한국인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 다른 아시아계 학생도 많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혼혈인이나 입양아가 대다수였다. 그나마 주말마다 한글학교와 한인교회에 출석하며 1.5세, 2세 친구들과 어울렸다. 공부는 나름 열심히 하고 클럽 활동과 봉사 활동도 꾸준히 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만나는 학생은 이미 모두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뤄낸 학생들이었다. 경쟁이 치열한 보딩 스쿨에서 대학 준비를 하며 정신력이 단단해진 학생들, 유명한 지휘자와 무대에 섰던 음대생들, 학교 바시티 스포츠팀에 뽑힌 선수들. 내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플루트를 연주해도, 중학교 때까지 했던 수영을 해도 그들 사이에서 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것 같아서 너무 싫고 두려웠다.
이에 더해 갑자기 한인 유학생 위주의 학생회와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회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 인구가 많은 곳에 있으니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아마 누구나 그렇듯 한국인 친구도 사귀고 다른 친구들도 사귀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끼리끼리 다니고 여름방학 때 이미 그룹들이 많이 형성된 분위기였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고민할 기회조차 없었던 상황을 두고 혼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했다.
조금 드라마틱하게 말하자면 돈 들이면서 괴로움을 사는 느낌이었다. 차라리 고등학교 친구들과 앨라배마 주립대를 갔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편입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노스웨스턴의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다들 어려워하는 것이 있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새삼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제 대학생활도 딱 두 쿼터만 지내면 끝이다. 되돌아보면 후회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더 당돌할 걸’, ‘더 자신감을 가질 걸’, ‘플루트 전공생이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연습할 걸’, ‘옆 레인에 수영 선수가 있으면 창피해 하지 않고 구경하며 배울 걸’, ‘한국인과 외국인 친구를 틀에 가둬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그냥 두루두루 사귈걸’,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등 아쉬운 점이 떠오른다.
나도 대학이 처음이었다. 앞으로도 처음이어서 잘 모르고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기겠지만, 그럼 또 주위를 둘러보고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나만의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