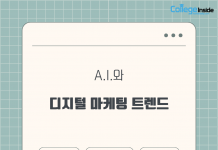주거 비용 급등으로 미국 명문대 대학생들이 트레일러에서 숙식하거나 노숙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10년간 새 주택 공급이 줄어 대학 근처 집세가 급등하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명문대 캘리포니아대학교(UC)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학교 10개 캠퍼스 전체 학생 약 30만 명 중 3165명이 음식과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1년 전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학교(UCSC)에서 주거 문제가 유난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UCSC의 학부생 중 9%가 노숙을 경험했다. 이는 UC 캠퍼스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산타크루즈에서는 2020년 산불로 인해 주택 900채가 사라진 데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원격 근무를 위해 이 지역으로 몰려든 근로자들로 인해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전국저소득주택연합(NLIHC)은 산타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으로, 캠퍼스 밖 집세가 한 달에 1300~1500달러(174만∼2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스티븐 매케이 UCSC 사회학과 교수는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 계급 학생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매케이 교수의 2021년 연구를 보면 UCSC 학생들은 집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차고나 수영장 창고 등 ‘불법적인’ 거주지에서 임시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80%가 주거 비용에 부담을 느꼈으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의 7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은 44%였다.
UCSC는 전체 학생의 절반인 약 1만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갖추고 있다. 이는 UC 캠퍼스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 대학이 운영하는 트레일러 주거지인 ‘캠퍼 파크’는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 중 하나다.
캠퍼 파크의 장점은 학교 밖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쓰는 아파트 임대료보다 훨씬 적은 비용인 800달러(107만원)에 트레일러를 혼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냉장고, 가스레인지, 운이 좋으면 오븐까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런 학교 시설에도 학생들의 주거난은 여전하다. 이에 UCSC는 2028년 가을까지 학생 37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 증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캠퍼스 근처 마을의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UCSC에서 학부생, 직원, 대학원생 등으로 13년간 있으면서 이사를 13번 다녔다는 로라 채플 씨는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도 교수가 돼 계속 학교에 남고 싶었지만, 주거 문제로 인해 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흰개미와 쥐가 출몰하는 UCSC 근처 집에서 룸메이트 6명과 함께 산다는 채플 씨는 “박사후 연구원이 돼서도 4~5년을 더 주거 문제로 힘들어지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김지혜(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