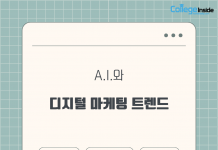“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다소 보수적일수 있지만 본인은 이 말에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본가는 대전이지만 한 번 사는 인생 큰 물에서 살아야지 싶었다.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께 자랑이 될 만한 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이와 상반되게 ‘수능은 3학년 때 보니까 3학년부터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시절 2년을 마냥 즐겁게 보낸 후, 현실에 직면했다. 위로 형제가 없어 굳이 그 중요성을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
나름대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기적을 꿈꾸며 노력했지만 장학금을 노린 지방대 하향지원까지 떨어지면서 나는 길을 잃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때문에 수능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는 바다와 같았고, 정녕 ‘인서울’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비싼 기숙학원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재수를 해서 이름있는 대학에 갈수 있을 거란 확신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찰나에 엄마가 제안한 말. 재수할래? 유학갈래? 그래. 재수생보단 유학생이 듣기에도 낫겠다 싶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한게 말로만 듣던 도피유학이더라.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한 행동 중 하나를 그 도피유학이라 하겠다. 미국에 온지 반 년쯤 되었을까? 한 대학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프로그램에 다니던 중이었다. 수능 볼 당시 구멍이었던 영어과목을 시간 재고 풀어 보는데 듣기평가 성우가 영어를 그렇게 또박또박 천천히 구사했었다니, 놀라웠다.
그렇게 미국에 오고 나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큰 꿈이 생겼다. 한국에 살면 서울정도는 가야하고, 미국에 왔으면 하버드는 가야지. 사실 구체적인 전공과 대학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 잡혔을 때, 그 대학이 하버드라 할지라도 내 성적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2년제 대학에서 꾸준히 성적을 만들었다. 그러던 도중 정한 목표가 바로 조지아공대의 산업공학.
꼼꼼한 성격에 매사에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던 본인에게 딱 맞는 전공이었다. 운이 좋게도 산업공학으로 1순위 대학인 조지아공대가 집 근처였고, 거기에 더 운이 좋게도 그 당시 다니던 커뮤니티칼리지와 조지아공대가 계약으로 맺은 편입 프로그램이 있어, 그 조건을 맞추면 합격이 보장되었다.
그 조건을 맞추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 와중에 부모님은 재정난을 겪으셨다. 생활비라도 벌자 싶어 뛰어 든 곳이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카페겸 빵집이다. 혹시라도 문법은 완벽하지만 스피킹, 리스닝이 늘지 않는 유학생이라면, 미국인이 주 손님인 가게에서 일할 것을 추천한다.
본인도 그런 사람 중 한명이었고, 이 곳에서 3년 반을 일하면서 얻은 것은 결코 돈 뿐이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던 나는 사장님이 보는 앞에서 하찮은 영어실력을 숨기기 위해 애써 무슨 말이든 내뱉어야 했다. 단언컨데, 그 이후에 영어에 대한 자부심도 확연히 늘었다. 그렇게 일과 학교를 병행하면서도, 시시한 인생의 큰 점을 찍기위해, 주저하지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편입 후, 그 큰 점의 효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단했다. 결국 해냈다는 그 느낌은 나 자신에 대한 가치와 개념을 크게 바꿔 놓았다. 남들에겐 애써 담담한 척 했지만, 조지아공대의 학생이라는 타이틀은 평생 낮은 자존감에 살아오던 나에게 가슴 벅찬 영광이었다. 내가 이러한 일도 해냈는데 어떤 일인들 못 해내겠어? 라는 거대한 기둥 역할을 했다.
물론 가끔 미국이란 참 무서운 나라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이 나라는 내게 기회를 주고, 나의 가치를 돌아보게 해주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무언가 원하던 것을 결국 이루어 냈을 때 그 성취감은 인생을 살게 하는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평생을 비주류에 패배자로 살았던 본인은 24살이 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의 가능성을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내가 나를 믿음으로서 많은 것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