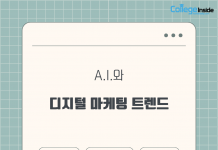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한지 어느 덧 4년이 넘었으니, 아이를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들에게서 진로 상담 요청을 종종 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화는 쉽지 않다. 같은 한국말을 해도, 실상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한지 어느 덧 4년이 넘었으니, 아이를 유학 보낸 한국 학부모들에게서 진로 상담 요청을 종종 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화는 쉽지 않다. 같은 한국말을 해도, 실상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경우:
“우리 애가 이번에 의대를 들어갔는데…” “에? 미국은 의학 전공이 따로 없는데요.””Pre-Med라고 하던데 그러면 의대 가는 게 아니야?””아뇨, 그건 의대가 아니라 의학 전문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한국과 미국은 전공에 대한 개념이 다소 다르다. 따라서 대학 생활을 계획할 때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쉬움만을 가득 안은 채 학교를 졸업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일단 한국이 전통적으로 ‘학과제’ 위주라면 미국은 ‘학부제’ 중심이다. 학부제란 비슷한 계통의 학과들을 ‘학부’로 모아 신입생들이 일정 기간 이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 학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같은 학부에 속한 과목끼리는 기본 커리큘럼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탓에 전공을 옮기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한 전문가는 “고등학교 때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못하고 진학한 학생들에게 추천할만 하다”고 한다.
학부제는 기초 소양을 풍부히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채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학과제의 커리큘럼과 비교했을 때 다소 수업의 수준이 ‘얕아’보이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 미국 대학에서도 3,4학년부터 심화된 과정을 듣지만,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몇몇 과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다. 9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학부제 전환을 실시했던 한국에서 “전공 교육 부실”이 줄곧 우려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나머지 전공 교육은 어디서 찾아야할까. 바로 대학원에서다. 이 사실에서 대학을 향한 미국 사회의 시각이 드러난다. 미국에서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본적’ 조건 중 하나다. 최근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일자리의 2/3 이상이 의무 수준 이상의 교육(some higher education)”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며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화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의무 교육의 수준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로 올라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한때는 일부 부자들에게나 허용되었던 상아탑 또한 오늘날에는 ‘다양한 전공과 사람을 접하고 기본 소양을 쌓는 곳’ 정도로 의미가 변했다.
때문에 학교에 들어와 전공을 정할 때, ‘나는 이 전공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덤비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상이다. 학부에서의 전공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다만 한발짝 물러서서 생각하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전공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면 대학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사회에 써먹는 것? 그 대답이 무엇인가에 대해 당신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전공 학부에서 듣는 수업들만으로 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으리라 방만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부들의 문을 두들기며 당신의 꿈에 맞는 스스로의 ‘커리큘럼’을 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