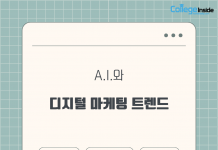“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2013년 대학 신입생 시절, 나는 ‘4년을 스트레이트로 다니고, 바로 졸업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런 내가 아직 대학 생활을, 심지어 한국에서 14시간 거리인 미국에서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졸업을 1년 남긴 내가 미국 유학을 결심한 계기는 꽤 단순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만 급급한 학교생활에 넌더리가 났고, 반복된 휴학과 복학으로 졸업에 대한 의지도 사그라지고 있었다.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 계획한 것은 한 학기 동안 어학연수로 뉴욕에 다녀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봄, 여름옷만 챙겨 온 뉴욕에서 나의 긴 유학 생활이 시작됐다.

뉴욕의 첫인상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내가 상상하던 뉴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불 친절함을 넘어 무신경해 보이는 입국 심사관, 악취가 풍기는 지하철 플랫폼, 무표정한 사람들, 자정 전에 모두 문을 닫는 음식점과 카페들. 뉴욕에서 4년을 보낸 내 친구는 뉴욕은 애증의 도시라고 했다. 이 도시에 진절머리가 나다 가도 방학 동안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뉴욕에 가고 싶어진다고. 6개월간의 어학연수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갈 때가 돼서야 그 말뜻을 알았다. 지금껏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내가 인생 첫 도전을 하고 싶어졌다. 그날로 부모님께 선전포고하고 편입 준비를 시작했다.

미국 대학 편입은 서류와의 싸움이다. 미국은 아직도 중요한 서류는 서면으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원본으로 준비 돼 있어야 하고, 여유분도 갖춰 놔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부터 대학교 재학 증명서, 재정 보증서, 예방 접종 기록까지 뭐 하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다. 내가 지원했던 학교는 국제 학생에 한해서 SAT 점수 대신 어학 성적만 요구했기에, 서류와 동시에 어학 점수를 준비해야 했다. 서류와 어학 점수가 충족됐다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메일 답장이 우편보다 느린 Admission Office와 몇 번의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최종 결과가 나온다. 나는 Grace Period를 단 1주일 남겨두고 편입 절차를 모두 마쳤다. 듣던 대로 미국의 일 처리 속도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다.

입학 허가의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3년을 한국에서만 살아온 내가 미국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수업은 알아들을 수 있을지, 친구는 사귈 수 있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늦게 등록한 탓에 OT는 참석도 못 했고, 수강 신청도 남은 과목을 긁어모아 듣게 됐다. 시작은 불안했지만, 살인적인 과제와 시험 스케줄이 오히려 학교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국처럼 팀플같은 과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 학기에 두 번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닌 한 학기에 최소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퀴즈와 시험을 치르기에 개강 후 얼마간은 남들을 따라가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과제에 파묻혀 살았다. 하지만 한국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교수님과의 시간도 장려하는 분위기라 진짜 배움의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아직도 한국 친구들은 내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신기하다고 한다. 미국에 온 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느 유학생처럼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고, 오늘은 저녁은 무얼 해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나를 보면 나도 신기하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그러나 그 결과가 주는 쾌감은 크다. 2018년 9월, 그렇게 나는 또 한 번의 편입으로 새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이했다. 내 나이 25살, 아직 졸업까지는 2년이 남았다. 누군가는 조급하지 않냐고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내 인생을 가고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