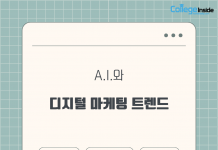어릴 적 ‘올인’이라는 드라마를 본적이 있다. 지금까지도 나의 명작 드라마로 꼽히는 그 드라마는 이병헌, 송혜교 주연으로 당시 미국 올로케이션 촬영이 화제가 됐다. 그 드라마의 첫 장면이 바로 그랜드캐니언이었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된다. 주인공인 이병헌이 헬기에서 내려 모레바람이 부는 그랜트캐니언 한 가운데에 우수의 찬 눈빛으로 서있었는데, 그 이국적이기만 한 장면이 당시 12살이었던 소녀에게는 적잖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그 때 그 소녀는 훗날 자신이 저 곳에 서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나는 어린 날 티비 속에서 보았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조지아에서 그랜트캐니언까지는 미국 끝에서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리가 멀다. 조지아에서 애리조나까지는 대략 3230킬로미터로, 30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총 12일에 일정이었지만 이동시간을 제외한다면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한 시간은 고작 3박4일 밖에 되지 않았다. 15인승 밴에 총 11명의 인원이 이동하는데 허리가 남아 날 리가 있나, 작은 밴에 여러명이 구겨져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이동해야 된다고 누가 미리 말이라도 해줬다면…그때도 나는 그랜드캐니언이 그토록 가고 싶었을까?
하루 온 종일 밴을 타고 이동하다가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근처 캠핑사이트로 이동해서 야영을 했다. 너무 늦은 밤이라 불도 제대로 켜지 못했고, 가끔은 겨울 비가 내리기도 했다. 아침마다 텐트위로는 서리가 꼈고,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씻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그랜드캐니언을 도착해서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총 20키로의 배낭을 매고 산행을 시작했다. 작은 체구의 나에게 그 배낭은 한번 앉으면 옆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 못 할 정도의 무게였다. 며칠 전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었고, 그 눈 때문인지 트랙은 굉장히 위험했다. 참고로 그랜드캐니언 안에 트랙에는 이렇다 할 안정장치가 되어있지 않다.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들 스스로가 주의하는 수 밖에는 없다. 캠핑사이트는 국립공원입구에서부터 여섯 시간을 걸어야 도착 할 수 있었다. 걷는 내내 이곳에 온걸 후회했었다. 밤 마다 너무 추운 기온 탓에 혹시나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울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땅속에서 올라 온 한기 때문에 온몸이 아팠고 발은 항상 동상이 걸려있었다.
하지만 모든 고생을 싹 잊게 해주는 단 하나. 저녁에 해가 지기 전 엔 가장 높은 골짜기로 이동해 앉아서 보았던 일몰이었다. 그 어떤 인공조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대자연 그대로의 그랜드캐니언을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디디고, 눈 속에 담았다. 지금 생각해도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랜드캐년에 간다는 것이 영하 22도의 추위 속에서 자야 하는 일 인줄 알았다면, 20키로가 넘는 가방을 짊어지고 6시간 산행을 해야 하는 일 인줄 알았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토록 가고 싶어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미리 포기했을 것이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 할 지, 시작 할 때는 몰랐기에 그토록 가고 싶어했었다.
나에겐 유학생활도 이와 같았다.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인지 안다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포기했을 것 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앞을 모르기에 그럼에도 궁금해 하고 나아가야 한다. 어림짐작으로 그것들을 불가능한 일이라 단정짓지 말자. 가늠하지 못했던 상황들이라 해도 모두 해낼 수 있었다.

12살 소녀는 티비 속에 나오는 저 멋진 곳에 자신이 서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미국에 혼자 유학 와 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공부를 하고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예측을 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졸업에 대한 압박, 유학생활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깜깜하기만 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레 겁먹지 않고, 미래를 궁금해 하며 꿈 꿀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