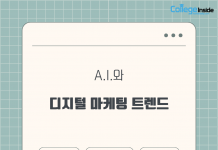“우리 같이 나이 먹은 노인네들한테는 이 마스크 하나하나가 아주 고역이지. 밖에 나가서 걸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
올해 초만 해도 뉴욕 퀸즈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주정근(71세)씨의 매일 아침 일상은 근처 공원 산책이었다. 하지만 산책하기 좋은 봄이 올 때쯤 정근씨의 소박한 일상은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일상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때 미국 COVID-19의 진앙지 중에 하나였던 뉴욕주,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뉴욕 시티는 세계 최고 확진자 및 사망자를 기록할 정도로 2020년 대재앙의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주지사의 강력한 방역 및 행정조치로 인해 하루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남부 주들에 비해 확산 속도도 줄어들었다.
“그나마 다행이죠. 한창 심할 때 3월인가 4월인가엔 눈 뜨고 나면 수십만 명 늘어나 있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수천 명 늘어나 있고. 올봄엔 꽃구경은 생각도 못 했다. 그냥 봄은 삭제됐다고 봐야지”
좋아하던 아침 산책까지 포기한 정근 씨는 가족과 함께 매년 봄에 가던 워싱턴 D.C.도 못 갔다고 한다.
“워싱턴 봄에는 한국처럼 벚꽃이 만발한다. 항상 봄에 아내랑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가는데 30년 만에 처음이구만. 허허 그 친구들 설날에 보고 못 봤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침 산책도 봄꽃 구경도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에 은퇴한 정근씨는 연금, 노인 수당, 아들의 용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다. 정근 씨의 아내도 작년에 은퇴해 마땅히 들어오는 돈이 없었는데 미국 경제 전체에 타격이 가는 바람에 정부에서 주는 긴급구호자금도 초기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 부부도 맞벌이였는데 이거 터지고 둘 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나 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원래 한 달에 한번 식사도 같이하고 용돈도 주는데 식사도 못 하고 전화만 했죠. 자기네들도 힘드니 줄 용돈이 어딨어.” 정근 씨의 아내 임선정 (69세)씨가 혀를 차며 말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쯤엔 확산세가 진정이 돼서 정근 씨 부부와 아들 부부는 다시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정근 씨 아들 주동석 씨(39세)는 걱정이 더 깊어만 간다.
“사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치의가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이 좋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마스크 쓰고 해야 하니.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걸어야지 마스크 쓰고 걸으면 그게 뭔가 싶다.”
동석 씨가 경험한 팬데믹으로 인한 한인사회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그동안은 몰랐던 미국의 열악한 보건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은 뭐 2차 3차 지원금까지 나왔죠? 검사도 무료로 해준다던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여기보단 쌀 거예요. 그리고 뭐 외식지원비 이런 거도 있던데. 뭐 그런 게 다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지만.”
정근 씨 부부도 동석 씨 부부도 처음에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한다. 실직 대상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되는 200달러를 받으려고 온갖 고생을 했다고.
“아시잖아요. 여기 미국 행정처리가 얼마나 느린지. 평상시에도 느린데 이런 비상시국엔 얼마나 느리겠어요. 아무튼 고의로 누락된 건지 이런 비상상황이 처음인 건지 지원금 못 받다가 여름에서야 그 돈을 받았죠. 그 후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본 기자의 기사에서 늘 언급했던 것처럼 동석 씨도 미국인들의 마음가짐을 지적했다. 마스크 등 기본 방역 조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
“여기 사람들 제가 오래 살아봐서 잘 아는데 다들 친절하죠. 그런데 정작 위급할 때는 이기적이더라고요. 마스크 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맞아요. 한국은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면 다들 군말 없이 쓰는데 여기 사람들은 뭘 강요하는 게 그렇게 싫나 봐요. 3월에 엄청 심했는데 4월에서야 주에서 마스크 강제 착용하라고 하고. 3월엔 마트도 못 갔어요 다들 안 껴서.” 동석 씨의 아내 송은진 씨(37세)도 거들었다.
동석 씨와 은진 씨는 12살과 9살 된 자녀 두 명이 있다. 두 명 모두 학교를 간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은진 씨는 조그마한 얼굴을 절반 넘게 넘는 성인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이 안쓰럽다.
“물론 아동용 마스크도 있는데 그냥 일반 감기 마스크뿐이다. 불편해도 참으라고는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둘째 규희는 자꾸 ‘이거 언제 벗어?’라고 물어본다.”
답을 해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만 간다. 날씨 좋은 날에도 놀러 가지 못하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동석 씨도 은진 씨도 한숨만 나온다고 한다.
“왠지 저희 잘못인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에게도 아이들 세대에게도.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께 효도해드리고 워싱턴도 가고 그래야 하는데.” 동석 씨가 또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겨울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은진 씨가 마스크를 한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고 있는 첫째 규빈이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미국에 다시 많아지고 있다던데.”
“봄이 오길 기다려야지.” 정근 씨가 손녀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눈도 바이러스도 싹 다 녹는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