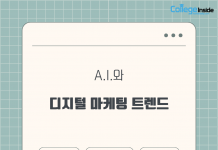1. 로맨틱. 경제학.
오늘 있었던 경제학 수업에서 “Dependent”의 정의에 대해 배웠다. “Dependent”의 정의를 들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그 정의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Dependent 하다는 것은 그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고, 그래서 의존적이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판매자이거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객이 그러한 예이다. 여기서 판매자가 단 한 명 뿐이라면, 그는 독점을 하게 된다.
Dependent 하다는 것은, 사랑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는 것. 세상에 오직 단 하나뿐인 당신. 그래서 의존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랑. 만일 더 좋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더 좋은 옵션을 찾아 떠난다면, 그건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이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독점적인 관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절대 금기인 그런 관계이다.
경제학에서 배우는 또 한가지.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그대가 되더라도, 독점이라는 것을 악용한다면, 아름다운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내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 남자친구에게 명품 백을 선물해 달라는 것은, 독점을 악용하는 것이 아닐까.
경제학에서 배우는 사랑.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학문에서 찾은 로맨틱이다.
1-1 뱀발.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만 같은 날이 있다.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은, 이 언니, 현타 (현자타임) 왔다고 그랬다. 사실 다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은, 내가 정말 원했던 한 가지가 없어서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라는 감정은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 사랑에 목메는 내가 철없고 어리게만 느껴진다.
밥 세끼 잘 먹고, 가족들 건강하게 있고, 늦은 나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큰 걱정 없을 나의 삶. 이 감사한 삶을 세상 다 무너진 표정을 하고서는 한탄하고,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부질없이 인생 테이프를 돌려보는 따위의 짓을 하며 허비하고 있자니 내가 봐도 참 한심하다.
사랑이 뭐길래.
어쩌면 진화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짝을 찾는 것은 나의 유전자를 세상에 남기는 아주 중차대한 (어쩌면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은 어쩌면 밥 세 끼를 먹어 오늘 내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도 나의 DNA 깊숙한 곳에서, 짝을 찾아 유전자를 남기는 사명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밥 세끼 먹어 하루를 그렇게 연명해 나간들, 유전자를 남기지 못하면 부질없다고, 내 안의 유전자들이 그렇게 내 실패한 연애에 항의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다, 부질없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2. Lightning 1976
학교 근처 미술관 BAMFA에서 본 짧은 영상이 있다. 한 젊은 여성이 차 안에 앉아 우리 쪽을 보곤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볼 때는 번개가 치지 않는데, 뒤를 돌아 볼 때마다 번개가 쳐요.
그리고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 보았다가 앞을 보기를 반복한다. 매번 여자가 뒤를 돌 때마다 번쩍하고 번개가 친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언제나 그 모습이어서,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의 가족들과 있을 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 그리고 직장 상사와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도 그렇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내가 본 세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내가 뒤돌아 본 사이 벌어진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도 세상의 일부인데, 무슨 이유에서건 나는 보질 못 하고 내가 보지 못 했기에 그 수많은 일들은 나의 세상에서는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내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번개가 쳐서 나는 볼 수 없다면, 적어도 영상 속 여자처럼 최소한 내가 보질 못 하는 번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3.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며칠 전 비가 내리고 난 뒤부터 날이 제법 쌀쌀 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은 손등이 하얗게 버석버석 말라가는 일이 자주 생겼다. 손등 위에는 언제 생겼는지 모를 베인 상처가 보였다. 룸메이트는 어젯밤 불을 끄고 담요를 펼쳤더니 정전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신기해 한참을 그렇게 담요를 펄럭이다 잤다고 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LA에 있을 때는, 밤에 나가지만 않으면, 겨울에도 낮에는 제법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곤 했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이곳에 도착해 처음으로 찬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는, 한국의 가을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가을,이라고 혼잣말로 말해 버렸다.
어렸을 때는 항상 새로운 것이 궁금했다. 가 보지 못한 여행지가 매력적으로 보였고, 유학이라는 두 글자에는 왠지 모를 신비로움과 함께 부러움이 녹아 있었다. 이제는 익숙한 것을 보게 되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온다.
익숙한 것은 편안하고, 그래서 마음이 놓인다.
4. 어쩔 줄 몰라 그냥 서있다.
앞으로의 내 인생을 생각해 본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겠지.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나와 교실을 같이 쓰던 아이들 중 몇은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했다. 나는 이 중 어느 것도 아직,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일까? 시간이 더 지나면 그럴 수 있는 것일까. 학교를 다닐 때 나는 언제나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학교에는 기준이 있었고 나는 그 기준을 넘기만 하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기준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와서 나는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라던가 직장을 구하는 시기, 결혼하는 것 따위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기준이었고 나는 사실 거기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였을까 하는 노파심이 드는 것이었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애초에 학창 시절 내내 내가 했던 달리기 같은 건, 내가 생각하던 것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고 나를 달래 본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상관없는 거라고. 속도와 방향 모두 내가 원하는 것이었을 때 의미 있는 것이라고.
그러다 문득,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하고 또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것이다.
5. 학생이고 싶은
아침 수업이 끝나고 찾아 간 대학 사무실에는 머리가 새하얗고 안경이 잘 어울리는 중년의 어드바이저가 앉아 있었다. ‘Quick Question’이라는 푯말이 눈에 띈다. 헬로라고 인사를 건넨 뒤에는, 대화를 어떻게 친근하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바로 질문을 던졌다.
“들어가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뜨네요. 저는 3학년 편입생이예요.”
그는 그 수업은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1, 2학년들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3학년이라 들을 수 없다는 그에 말에 실망스러웠다. 그는 왜 그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지 되물었다.
“관심이 있어서요!”
글짓기에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에 글짓기 관련 검색을 하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에게 조금의 미안함을 느끼며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싶은 이유는 그냥 글짓기에 관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자서전에 대해 공부한다고 해서 예요.”
하지만 3학년은 들을 수 없다는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학위를 따기 위해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학문의 탐구를 위해 수업을 듣는 것을 막을 줄은 몰랐다.
어쩌면 대학의 존재 이유는 바뀐 지 오래 일지도 모르겠다.
<류혜민>